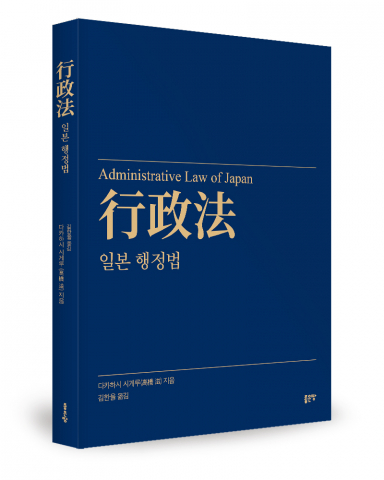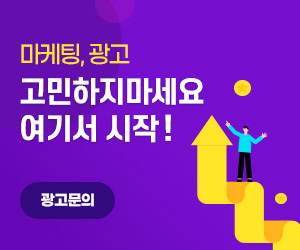[행정법의 미시와 거시를 조망하다 – 『일본 행정법』으로 읽는 법체계의 질서와 감시의 문화]
행정의 작동 원리는 사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늠하는 거울입니다. ‘법의 그늘이 닿지 않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를 가장 치열하게 구현하는 분야, 바로 행정법이죠. 최근 좋은땅출판사에서 출간된 『일본 행정법』은 이러한 통찰을 일본 법제도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탐색하도록 이끄는 귀중한 지적 도구입니다. 다카하시 시게루 교수가 집필하고 김한율이 번역한 이 책은 일본의 행정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며, 권력과 시민 사이에 놓인 법의 교착점을 세밀하게 조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일본 행정법’일까요? 일본과 한국은 유사한 현대 국가 체제를 공유하면서도 법제도 운영 방식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차이를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각으로 직조해내며, 비교법적 통찰을 거듭하게 합니다.
1. 일본 행정법체계의 치밀한 해부 – 실무와 학문의 교두보
『일본 행정법』은 단순한 개론서 이상의 구성력을 지닙니다. 행정조직법, 행정행위, 행정소송, 국가배상까지 일본 행정법의 주요 영역을 일관된 틀로 재구성해 입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특히 행정절차와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법치행정의 실현 과정과 권리 보장 장치를 어떻게 조율해왔는지를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법은 절차다”라는 표현처럼, 일본은 무명(無名)의 행정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비강제 행정작용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오랜 법적 논의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접점은 오늘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권리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한국 사회에 유효한 반문을 던져줍니다.
2. 행정작용의 복합성과 통제성 – 권력의 사용법에 대한 질문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강점은 행정작용 분야의 깊이입니다. 법률이 명시한 강제적 행정행위 외에도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입법 등 다양한 형태의 권한 행사 방식이 단지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정책 실현의 중요한 도구로 기능함을 일깨워줍니다.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를 일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차분히 풀어냅니다.
특히 다카하시 교수는 행정행위 개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며, 이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엮어 실천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행정법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라는 그의 말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비판적 사유의 축을 보여줍니다.
3. 비교법 문화의 장 – 일본 행정법에서 배우는 법적 시민성
『일본 행정법』은 행정 규범과 시민 권리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법조문이 아닌, 법적 사유의 문화로 풀어냅니다. 이는 한국 행정법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컨대, 일본은 너무 완성도 높은 행정행위 개념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개별 사안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론 체계의 통일성에서 도전이 많은 편이죠.
해당 책은 이를 “제도와 문화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법의 차이”로 설명하며, 법을 단지 기술이 아닌 민주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학자나 정책 입안자는 물론,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법 감수성을 키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통찰을 제공합니다.
4. 저자의 학문적 역량과 번역자의 균형 감각
본서를 집필한 다카하시 시게루 교수는 히토쓰바시대학을 거쳐 현재 호세이대학에서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일본 행정법 분야의 중추적 학자입니다. 그는 과학기술정책, 환경행정, 위험관리 등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회변화와의 접점에서 행정을 성찰해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구조적이면서도 실증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 책 역시 그런 면모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한편, 번역자 김한율은 법학적 개념의 충실한 전달은 물론, 일본 법제의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섬세한 번역을 통해 텍스트의 깊이감을 배가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현행 한국법체계와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기에, 일본어 원전을 접하기 어려운 독자에게도 충분한 독서가 가능합니다.
독서를 넘어 사유로 – 문화적 법감수성 키우는 길잡이
헌법 바깥의 ‘사소한 권력’은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법』은 그 무대가 동아시아 일본이라는 점에서 특히 유용한 대조의 거울이 됩니다. 본서를 통해 독자는 권리를 법으로 요청하는 방법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 즉 행정의 이면을 읽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다시 고민하고 싶은 분이라면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본서를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한국 행정법 입문서, 박홍우의 『행정법 강의』나 윤영진의 『행정법』과 비교해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문학도 행정, 예술도 통제와 자율의 문제를 말합니다. 돌고 돌아, 결국 ‘법’은 우리의 문화라는 점에서, 이런 사유의 여유는 과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