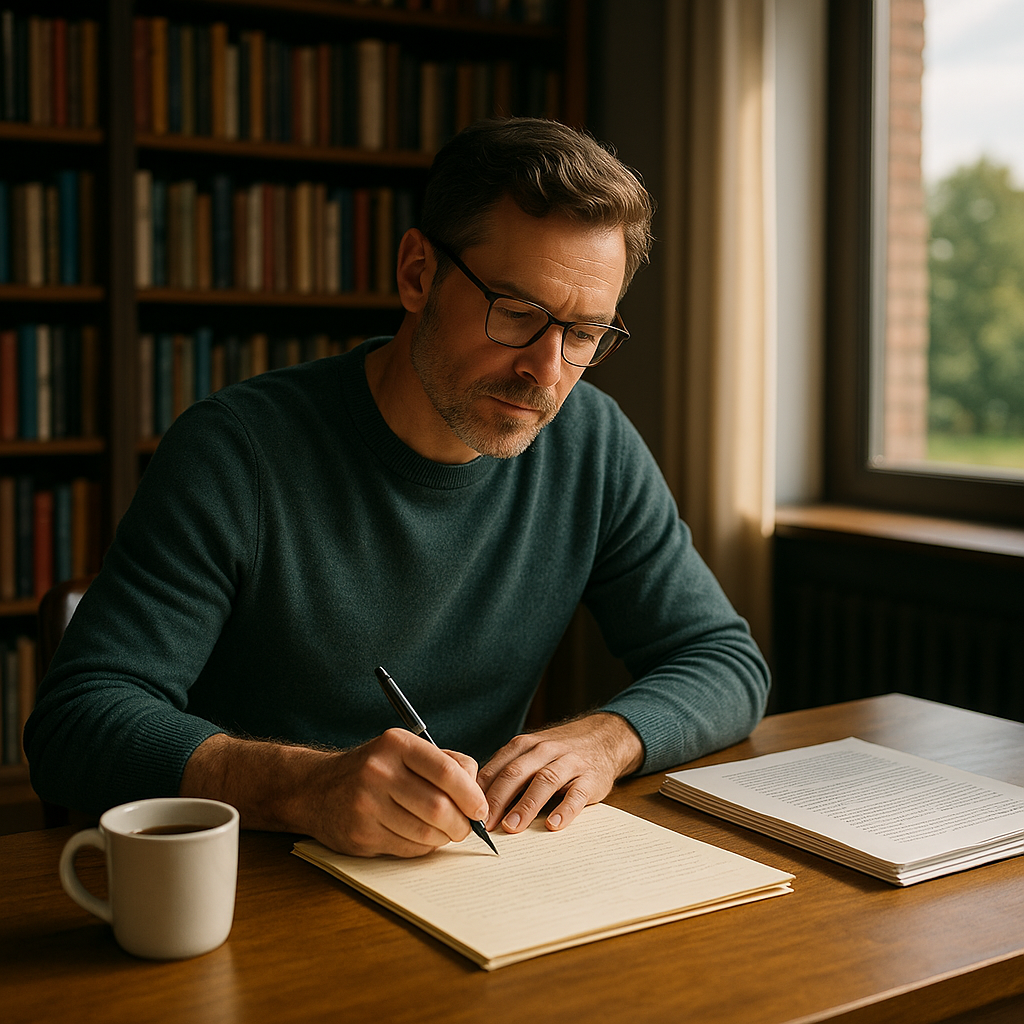미국 진보 정치의 전환점, ‘마음에 닿는 정치’를 말하다 – 란디 와인가튼이 전하는 민주당을 위한 문화적 교훈
정치 또한 예술처럼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공감의 울림을 만들어야 살아 숨 쉰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교사노조연맹(AFT) 회장이자 오랜 민주당 활동가였던 란디 와인가튼(Randi Weingarten)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 평론 너머에서, 우리 시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미학과 소외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다시 묻는다. 그녀가 최근 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떠나며 남긴 목소리는 _‘듣는 정치, 체감되는 약속’_이라는 정치문화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당 내 갈등이 아니라, 정치 표현이 예술적 설득력을 잃을 때 대중이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를 배우게 된다. 특히 뉴욕시장에 도전한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캠페인은, 공공성이라는 오래된 가치에 ‘새로운 미적 감각’을 더해 시민과 실존적 연결을 맺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1. ‘말’보다 ‘느낌’을 남겨야 한다 – 소통의 예술로서의 정치
란디 와인가튼은 “정치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민주당이 ‘빈 말’이 아닌 적극적인 거리 활동, 연대, 정보 전달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법안—에 맞서야 하는 시점에서 DNC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이 비평은 ‘예술에서 메시지가 관객과 연결되지 않을 때 작품은 죽은 것과 같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2. 맘다니 캠페인, 공공가치의 ‘스핀오프 드라마’
무명의 뉴욕 정치인 맘다니가 핵심 의제로 내세운 ‘생활비 위기’는 단지 경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강렬한 서사의 서커스를 만들었다. 그는 연설, 소셜미디어 영상, 거리 만남을 넘나들며 감정을 건드렸다. “‘이 사람 내 얘기하네’라는 느낌. 그게 정치다”고 와인가튼은 말한다. 맘다니의 캠페인은 정치적 퍼포먼스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연극 무대로 바꾸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다.
3. 포용의 민주당 – ‘큰 천막’으로 다시 짜야 할 이야기 구조
와인가튼은 지금의 민주당이 젊은 활동가나 비주류 지지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육활동가 데이비드 호그(David Hogg)에 대한 냉랭한 대응은, 목소리 많고 다채로운 청중이 사라진 단조로운 무대와 같다. 이 대목은 정치가 문화일 때 가장 강렬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다양한 시선과 리듬이 어우러질 때 정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4. 교육과 노동, 미래를 만드는 ‘사회 창작자’의 영역
정치적 메시지를 형성하는 또 다른 공간은 공교육과 노동조합이다. 와인가튼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립학교 예산 감축, 교육부 해체 발언 등으로부터 정치가 미래를 기획하는 ‘문화적 공공재’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교육은 곧 감정을 수양하고 상상력을 확장하는 경험이기에,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예술처럼 ‘함께 만들고 가꾸는’ 것이다.
5. 정치가 되살려야 할 감각: 신뢰, 귀 기울이기, 그리고 감정의 언어
결국 와인가튼이 전하는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문화 기획에서도 핵심 원칙이다—관객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배워야 할 것은 ‘방법론의 예술’, 즉 기술이 아닌 감각의 민주화다.
오늘날 문화 향유자나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정치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맘다니와 같은 사례는 우리가 왜 정치를 '감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증명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창작이자 값비싼 전시, 공연, 소설보다 더 실재적인 ‘삶 속 서사’ 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콘텐츠의 감상자로서, 다음의 행동을 제안한다:
- 조흐란 맘다니의 연설 영상이나 캠페인 클립을 주의 깊게 분석해보고,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해석해보자.
- 란디 와인가튼의 발언을 토대로, 각자의 지역 정치에서 '들리는 메시지'와 '느껴지는 실천'의 차이를 점검해보자.
-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콘텐츠—연극 <1984>, 영화 <링컨>, 또는 시민예술 프로젝트 등—를 탐색하며, 정치의 미학성을 재발견해보자.
- 마지막으로, 교육과 지역사회 문제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련 단체에 후원하는 등, ‘문화적 실천가’로서 행동해보자.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모든 창작물처럼, 정치도 결국 ‘공감이 남긴 흔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을 다시 복원할 때다.